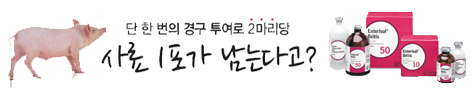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다. 나이의 적응이 되지도 않고 바뀐 새해가 익숙해지기 무섭게 세월은 지나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도 지난해를 돌이켜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다짐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마음속으로 새기고는 한다.
음악회장에서는 신년음악회를 많이들 개최한다.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연주인들은 매일 연습하고 합주한다. 한 곡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리며, 전공악기로 평생을 보낸 분들의 경우 신년음악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타종 행사와 같다.
이번 호에서는 음악회에 가기 전 기본적인 음악회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 사람아~!!
음악회 하면 모두들 어려운 공연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한다. 막상 음악 자체를 즐기는 것조차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사실 음악회는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지만, 무료 공연도 많이 있다. 또한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수요일 오전에 하는 브런치 음악회도 있다. 브런치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이 자유롭진 않은 주부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공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연주회 나 뮤지컬에서 공연 전에 안내 멘트로 “이 공연은 인터미션이 없습니다. 공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공연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이다.
이는 쉬는 시간 없이 공연한다는 뜻이다. 공연이 긴 경우는 1부 공연이 끝나고 나면 보통 1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있다. 이것이 인터미션이다. 공연 중에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장실은 공연 전에 미리 다녀오거나 인터미션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필자는 연주하는 데 있어서 인터미션 시간에 물을 조금 마시거나 연주인들끼리 사진을 찍고는 한다. 입으로 부는 관악기는 음료를 먹으면 악기가 상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거나 동료들과 긴장도 풀 겸, 사진도 찍고 다음 2부를 준비하기도 한다.
박수칠 때는 제대로
클래식 음악회에 가면 도대체 언제 박수를 칠 것인지가 무척 고민이 된다. 클래식 공연은 대부분 여러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 악장이 끝났을 때, 또는 음악이 멈출 때 박수를 칠까?
사실 곡마다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지휘자를 본다. 지휘가 끝나고 지휘자의 두 손이 내려오면 이 곡이 끝난 것을 알 수 있다. 필자 역시 음악을 전공했어도 그 많은 악장을 구별하기란 어렵다.
또 하나의 팁은 팸플릿을 보면 곡의 제목 아래 몇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이라는 곡은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팸플릿에 악장별로 셈여림이 나타나 있다. 그럼 3번의 간격 이후 4번째 박수를 치면 되는 것이다.
박수를 칠 때는 연주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끝났을 경우 원하는 만큼 치고, 잔잔하게 끝나면 여운을 느끼듯이 천천히 친다. 끝 곡의 경우는 클래식 공연에서는 앙코르보다는 큰 박수를 치는 것이 앙코르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연주가 끝나서 박수를 치고 벌떡 일어나 공연장을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피한 용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앙코르 연주가 끝나고 연주자들이 퇴장한 후 자리를 떠나는 것이 에티켓이다.
필자는 앙코르곡을 연주할 때가 가장 신이 난다. 연주 동안 긴장을 하고 집중하다가 앙코르곡을 할 때는 왠지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럴 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맥이 풀린다. 무대에서 객석은 누가 있는지 모를 것 같지만, 사실 다 보이기 때문이다.
찰칵찰칵
요즘 유행하는 것이 인증사진을 찍는 것이다. 문화를 즐기는 나 자신을 찍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클래식에서는 ‘NO! NO!’이다.

공연장에서는 주최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촬영은 금지하고 있다. 공연 중 사진을 찍는 행동은 주변 관람객은 물론 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행동이다. 필자는 공연장이 아니라도 티켓을 찍거나 입장 전 로비를 찍는 등 나만의 인증사진으로 SNS을 즐기기도 한다.
또한 음식물 반입은 물론 껌도 씹어서는 안 된다. 필자 역시 모르고 껌을 씹고 있다가 안내하시는 분이 휴지를 주셔서 얼른 껌을 뱉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연주회장에는 꽃이나 부피가 큰 선물을 연주자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갈 경우, 로비주위에 위치한 안내석에 물건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 무료로 이용되는 서비스이며 어떤 물건도 맡길 수 있다. 물건을 주면 번호표를 받고 찾을 때 번호표를 주게 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있으면 음악 감상에 집중도 안 되고, 또한 꽃다발의 바스락바스락 비닐소리가 연주인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도입된 것 같다. 예전엔 꽃다발을 들고 연주를 본 기억도 있긴 하다.
공연 전 꿀팁
클래식 공연장은 그리 어려운 곳이 아닌데, 공연장에 가려면 의상이 많이 신경 쓰인다. 필자는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가는 편이다. 편안한 복장으로 가면 되지만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그 또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또한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곡을 들으러 가는지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다. 공연포스터나 팸플릿에 실린 작곡자나 제목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공연장에 들어가면 더욱더 즐거운 감상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공연장에 조금 일찍 간다. 사람이 많은 공연장에 가면 기침을 자주 하는 편이라 기침이 나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사탕을 준비해간다. 조용한 공연장에서 기침소리가 연주를 망치는 소음이 될까 봐 걱정되기에 사용하는 나만의 방법이다.
핸드폰의 경우 진동도 방해되기 때문에 무음이나 꺼두는 게 좋다. 참고로 연주자들은 귀가 많이 예민하다.
조율(튜닝)
공연 시간을 지키는 건 클래식 공연뿐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모든 공연에서 지켜야 할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매너이다. 보통 공연 10~15분 전에 입장이 시작되며 본의 아니게 늦을 경우에는 우선 출입구 쪽에 있는 빈 곳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 후 인터미션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자리에 착석한 후 공연 시간이 되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입장한다. 입장 후 단원들이 자신의 악기 조율(튜닝)을 시작한다.
오버에나 피아노가 ‘라’음을 내고 나머지 단원들은 이음에 맞춰 자신의 악기를 조율한다. 이때, 이 시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매너이다.
등장했다고 박수를 치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왔다고 이름을 부르고 환호성을 내는 것은 단원들의 집중력을 해칠 수 있다.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하면 같은 곡이지만 다른 음으로 연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공연 역시 편식은 금물이다. 음악을 예를 들자면 사물놀이, 판소리 같은 국악, 교향곡, 관현악곡, 성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해보고 우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장르를 만든 후 점차 다른 장르로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음악회에는 인터미션이 있듯이 2018년 첫 달에 여러분의 인터미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혼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막연히 음악회에도 한번 가보면서…. 필자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독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간 피그 2018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