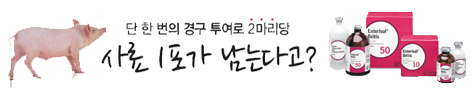학교종이 땡땡땡…
졸업식을 하고 봄방학 이후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생들에게는 한 해의 시작인 것 같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초등학교(필자는 국민학교 세대) 입학식에 옷핀으로 긴 수건을 예쁘게 접어 왼쪽 가슴에 달았던 기억이 난다. 손수건 위에 이름표처럼 매달던 그 시절에는 이것이 아침 일과 중 하나였다. 지금처럼 물티슈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손수건을 매달고 등교하는 것이 책가방 챙기는 것만큼 당연하였다.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노래 중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동요가 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부르는 노래의 원제목은 ‘학교종’이다. 아마도 노래가사의 시작되는 앞 가사가 ‘학교종이 땡땡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 같다.
이 노래는 종을 주제로 한 곡이 아니고 학교를 주제로 한 곡으로 1948년에 발표되어 오늘날까지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던 김메리 여사의 유일한 동요작품이다. 4분의 4박자 다장조의 기초 음악적 동요로써 단순한 노랫말과 가락 리듬에서 음악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1904년 태어난 김메리 여사는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30년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에는 영문학을 전공하다가 곧 음악으로 전공을 바꿔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32세 때 미시간주(州)에서 사업을 하던 조오홍 씨와 서울에서 결혼했지만, 일제가 친미파라는 이유로 남편을 추방하고 김메리 여사는 출국을 금지시켜 홀어미 아닌 홀어미 신세가 됐다.
김메리 여사는 모교에서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광복을 맞고 현제명, 김성태 등과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학교종은 전차 속에서 어린이들이 입학 첫날 등교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30분 만에 작사, 작곡했다고 한다. 학교종은 우리나라 사람이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동요로 알려져 있다.
동요(童謠)
동요는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그중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동요를 ‘구전동요’ 또는 ‘전래동요’라고 부른다. 대부분 전래동요는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고, 길고 긴 시간을 지나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동요를 일컫는다.
전래동요는 짧고 간결한 리듬이 되풀이되며, 쉽고 흥겹게 따라 부르기가 쉽다. 특히 전래동요 중에는 어른들의 마음이나 시대적 상황을 어린이 입을 통해 노래로 부른 것들이 많은데, 최남선의 ‘우리 운동장’이 그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운동장
태평양이 우리의 운동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서 조선의 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드넓은 태평양은 조선 소년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이자 경주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요 중에는 우리나라 동요가 아닌 일본 동요에 노랫말만 바꿔 놓은 곡들이 많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등 이 노래들도 원래는 일본동요였다.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는 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문화로 녹아든 것이다.
물론 노랫말을 바꿀 때 우리나라 감정과 시대상이 들어가 있으니 일본노래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문화가 완전히 독창적일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애국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는 1936년 안익태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음악공부를 하던 중 작곡했다. 애국가의 가사는 윤치호, 안창호, 민영환이 만들었다는 설은 있지만 확실치 않다.

애국가의 가사를 스코틀랜드 민요 Auld lang syne(올드 랭 사인)의 곡조에 따라 불리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안익태는 1919년 3.1운동 때 애국가 가사를 처음 알게 되어, 작곡하여 완성하였다. 그해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선수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때 처음으로 애국가가 불려졌다.
애국가는 안익태가 나라 사랑의 뜻을 담아 개인적으로 만든 곡이기 때문에 개인 저작권법을 적용받는데, 2005년 그의 부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애국가는 한국 국민의 것이라며 저작권을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지휘자 안익태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애국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봉숭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은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우리 민족은 항일 독립의식과 예술적 감정을 창작 음악과 연주 활동을 통해 드러냈다.
식민 초기인 1910년대에는 우리 가사조의 노랫말에 서양 음악에 기반을 둔 창가가 작곡되어 불리게 되었다. 그중에 봉숭아(홍난파 작곡, 김형준 작사)는 필자가 참으로 좋아하는 곡이다.

3·1운동 직후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의 총칼 아래 짓밟힌 우리 민족의 슬픈 운명을 울밑에 선 한 송이의 봉숭아로 표현하고 있는 가사 또한 너무나도 서정적이며, 봉숭아는 울 밑이나 장독대 옆에 피는 꽃을 가사에 쓴 것이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귀족의 화려한 정원에는 결코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민요나 가요의 가사에서 봉숭아가 피어 있는 장소는 언제나 장독대 아니면 울 밑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자결한 여인들이 환생하여 봉숭아가 되었다고 하며, 꽃말은 “나를 건들이지 마세요”라고 한다.
이 곡은 1942년 김천애(당시 23세)가 일본 동경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앵콜송으로 불렀다. 앵콜송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떠나지 않았으며 동포들은 무대 뒤로 찾아와 김천애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후 귀국한 김천애는 무대에 설 때마다 한복을 입고 이 노래를 불러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일제는 가창금지, 음반판매 금지를 시키고 김천애는 일제 경찰에 잡혀가 여러 차례 모진 고초를 당했다고 한다. 또한 이 노래를 부른 학생들을 잡아다가 의자에 묶어 놓고 집게로 혀를 뽑아 죽인 일이 있는데, 실제로 밝혀진 것만 해도 386명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봉숭아는 지고 나면 방긋하게 열매를 품고 있다가 씨앗을 투두둑 뱉어낸다. 어린 시절 소꿉장난을 할 때 손톱에 물을 들이고 씨앗을 손끝으로 만지기만 해도 그 씨앗들이 사방으로 튀어 나가는 게 참으로 신기했다.
꽃은 아름답게 피고 지는 것인데…. 당시 우리나라 민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한숨 속에서 지샜다. 이를 닮은 미처 피지도 못한 젊고 어린 봉숭아꽃들을 생각해 본다.
<월간 피그 2018년 3월 호>